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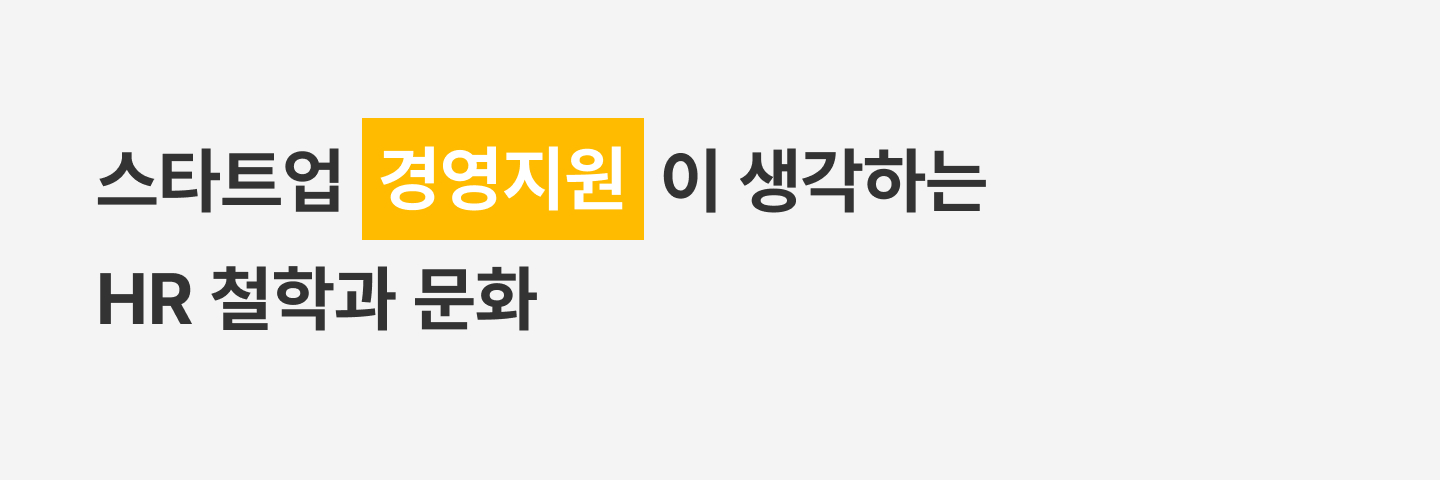
저희 대표님은 회사의 방향성과 경영지원이 추구하는 인사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본인의 다양한 식견을 나누어주시곤 하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깊은 통찰에 감탄하게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제 평소 생각과 비슷한 방향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 나 꽤 잘 맞는 회사에 와 있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저만 들을 수는 없죠,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제 경험 한 스푼 얹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저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B2B SaaS 이야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스타트업에서 처음 HR업무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조직 문화’에 꽂히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열정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멋진 조직 문화와 HR철학을 제공하면, 정말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좀 더 몰입하게 하려면, 조직 차원에서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유명 스타트업은 어떤 조직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 했는 지 궁금해지고, 《규칙 없음》,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배민다움》 같은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HR과 조직문화에 대한 다독(多讀) 시대가 열립니다.
시중에 있는 다양한 HR·조직문화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대단하다!’,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했구나!’ 싶고, 과거의 열정 넘치던 저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 비슷한 시도를 하곤 했습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복지, 무한한 자유, 자유로운 업무 환경, MVC 만들고 환경 조성하기 등…
구성원의 역량은 이미 뛰어나니, 조직이 좀 더 혁신적인 문화를 만든다면 더욱 몰입할 것이고, 그렇게 조직은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여기서 잠깐..! 열정은 잠시 넣어두고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적절한 벤치 마킹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 있고, 어떤 조직은 성공적인 벤치마킹으로 조직의 성장까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칙과 도전을 우리 조직에 적용하기엔 구성원들의 성향, 대내외적인 환경, 회사의 BM, 경제적 상황 등 무수히 많은 부분이 다르기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니콘 스타트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조직만의 HR원칙을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HR 원칙이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기존 임직원보다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도록 Bar Raiser를 둔다’, ‘해당 지원자는 슈퍼스타가 될 자질을 봐야 한다’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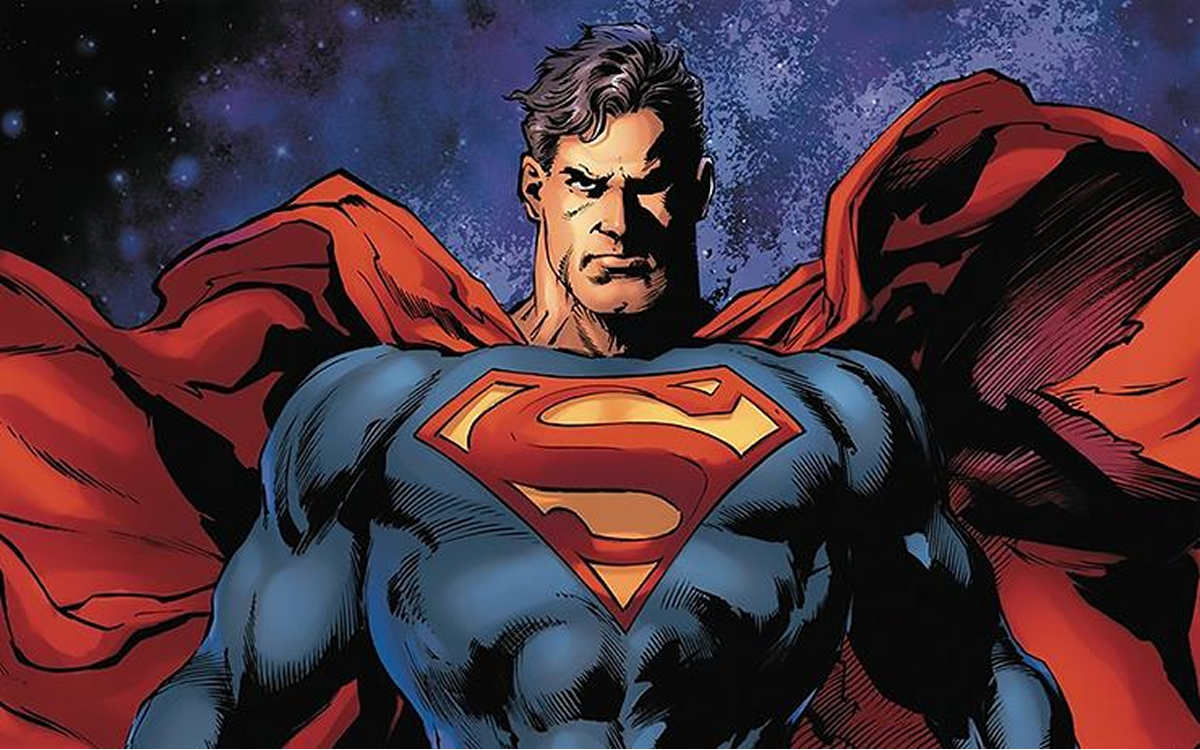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적용할만한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채용은 지금 있는 구성원보다 더 뛰어난 사람만 채용하고, 그렇게 모인 개인들이 슈퍼스타처럼 100% 이상을 해내는 조직은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원칙을 고수했기에 지금의 아마존이 있었다고 아마존은 말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라면 그 원칙을 그대로 우리 채용 기준에 넣고 고집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저 원칙을 고수한다고 아마존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아마존의 원칙이 잘 맞는 조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모두가 1인 사업자처럼 움직이는 문화라면, ‘보통의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다릅니다. 뛰어난 슈퍼스타도 필요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보통의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조직의 슈퍼스타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탁월한 역량, 도전 정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력, 번뜩이는 아이디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죠. 이들은 조직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엄청난 혁신과 도전을 해내지 않아도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늘 제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일을 해내는 사람들, 조직이 매일 흔들리지 않고 굴러가게 만드는 건 이들의 성실함입니다.
‘범재(凡才)’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쌓여 조직의 기반이 됩니다. 슈퍼스타가 성장을 이끈다면, 범재는 그 성장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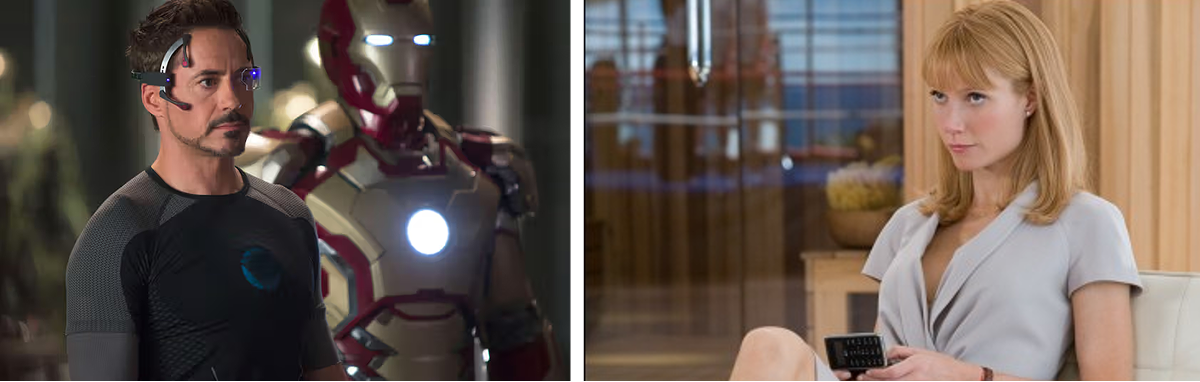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은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성장과 혁신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화할 사람,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뒷받침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시계는 수백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듯, 조직 역시 다양한 직무와 역할로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직무나 역할은 없습니다.

많은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최고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최고’는 혁신과 도전을 이끌 슈퍼스타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120%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슈퍼스타만 모은 조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 업무를 해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슈퍼스타에게 지원 업무를 맡긴다면 그건 그의 능력을 50%도 활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내부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회사만의 HR정책과 문화겠죠.
이제 ‘슈퍼스타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제는 우리 조직의 각기 어떤 분야에 슈퍼스타가 필요하고, 범재가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채용,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 바로 그것이 경영지원의 역할 아닐까요?
여러분 회사만의 HR 철학과 문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영지원 담당자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작성한 다른 인사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30명 팀을 혼자 관리하며 깨달은 스타트업 경영지원 업무 >
▸ 스타트업 경영지원, 탈주하지 않고 살아남는 5가지 비법 >
